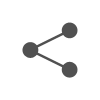지방자치단체가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를 점찍으면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유치해 지역 병원·학교와 연계,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확대 속에서 천연물, 해양 생물, 화장품, 세포주 등 지역 특화 산업을 바이오와 결합해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기존 바이오 클러스터가 제도, 기술투자, 지리적 요건 등으로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국은 ‘바이오 열풍’
올해 들어 바이오 분야 산업단지 혹은 거점(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10여 곳에 이른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주춤했던 지자체 바이오 투자가 엔데믹과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필요함에 따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가장 뜨거운 영역은 ‘바이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다. 국내에서 첫 구축되는 바이오 특화단지는 5년간 2조2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과 인허가, 용적률 상향, 세액 공제, 정부 R&D 우선 투입, 테스트베드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신청 접수에 인천,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 지자체 11곳이 뛰어들었다. 최대 규모 바이오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저마다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최적 후보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사업 수주 외에도 지역 특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별도로 추진 중인 곳도 많다.
제천시는 기존 천연물(한방) 기업과 설비를 활용한 생물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방천연물 산업과 연계해 생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바이오 거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경북 안동과 울진은 각각 백신과 천연물 기반 소재(마린펠로이드)를 활용한 산업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 앵커 기업 보유를, 울진은 풍부한 소재를 강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밖에 옥천(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의성(바이오밸리), 진주(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포항(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시흥(글로벌 바이오허브) 등이 자체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남원과 울산 등은 바이오 육성 전략 수립에 착수, 바이오 거점 구축을 포함한 포괄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고령화·저성장 대비…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오송, 대구, 서울(홍릉), 대덕, 원주, 화순 등 15개 시도에 25개 바이오·제약 거점이 운영 중이다. 현재 인천에는 미국 보스턴 ‘랩셀트럴’을 지향하는 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 중에 있으며, 충주 역시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다. 강원은 더존비즈온 등 기업과 협업해 정밀의료규제 자유특구를 조성하고 있다.
지자체의 ‘바이오 열풍’은 고령화에 따른 바이오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지속 성장해 2029년에는 3조6000억달러(약 48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보다도 3배 이상 크다.

지자체는 고령화로 인해 의약품 수요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를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역에 기반한 바이오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필수다. 곳곳에 존재하는 유휴 부지를 개발하고, 단기간 성과를 창출하는데 클러스터 전략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과거에 성행했던 ‘묻지마식 투자’ 유치가 아닌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바이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제천(천연물), 울진(마린펠로이드), 안동·의성(세포)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뿌리산업에 바이오를 더해 첨단 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저마다 바이오를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것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오산업 특성상 신약 개발 등 성과가 나오는데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바이오 클러스터는 단순히 기업과 설비가 한데 모인 것을 넘어 기업-학교-병원-연구기관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 시너지를 내야 한다.
장기적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상당수 지역이 앵커 기업은 물론 병원, 학교 등 구성 요소가 빠진 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오송, 대덕 등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 역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제도나 기술·설비 투자, 기업과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철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한 바이오 클러스터 관계자는 “바이오는 고령화와 함께 수도권에 몰린 기업 연구소, 생산시설을 유치해 지방소멸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며 “클러스터는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생물과 같은 만큼 오랜 시간과 자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단기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기업만 집적시킨 산업단지형 모델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 올리비아 로드리고, 첫 내한공연 오픈과 함께 매진…1회 공연 추가
- 코스피,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 마감
- 코스피,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 마감
- 코스피,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 마감
- 금리 인하 기대 커지며 상승 마감한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