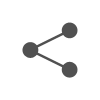[교사 김혜인] 평소보다 마음이 분주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틀 뒤에 수술이 잡혀 있었다. 오전에 아이 발달 치료가 끝나면 어린이집에 보낸 뒤 병원에 갈 계획이었다.
분주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분한 태도로 감추며 아이 등에 손을 대고 현관으로 이끌었다. 문득 아이 등에서 뜨끈한 기운이 느껴졌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이 이마에 다시 한 번 손을 대어보곤 체온계를 가져왔다. 38.2도. ‘엄마에게 가 봐야 하는데…….’ 계획했던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감기가 오려나. 집에 상비해 둔 해열제를 먹였다.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필이면 엄마가 입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아이가 아픈 게 난감할 뿐이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다. 해열제를 먹여도 좀처럼 열이 떨어지지 않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39도 이상 오르고 기침이 시작되었다. 엄마에겐 내일 가겠다고 연락하고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부터 다녀왔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엄마가 수술을 받을 때도 가지 못했다. 아이가 이틀 동안 고열로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열이 잡힐 때쯤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자다가 기침을 하며 토를 했다. 열이 또다시 올랐다. 두 번째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폐렴이 확인되었다.
웬만큼 열이 나도 깔깔거리며 놀고, 발버둥 치며 떼도 잘 쓰던 아이가 누워만 있었다. 눈 주위가 불그레한 채 이불을 끌어안고 누워 있는 아이 얼굴을 쓰다듬으면 그 열이 고스란히 내 손에 전해졌다.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그저 아이 곁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다. 이 어린 녀석이 자기를 돌보아 주는 걸 아는지, 주는 대로 약을 받아먹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주어도 가만히 있는다.
‘아기 때는 엄마 애간장 다 녹인다. ’ 병원에 오지 않아도 괜찮다 엄마가 문자를 보내셨다.
아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가 내게도 이렇게 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대여섯 살 무렵이었을까. 열이 많이 나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어릴 적 기억에 엄마는 바빠서 집에 잘 있지 않았는데, 그날은 해가 다 저물지 않는 초저녁에 집에 왔다. 손에는 오렌지가 들려 있었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형제가 많아서 늘 값싼 귤만 먹었고 오렌지라고 구경해 본 것도 아주 작은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엄마가 가져온 오렌지는 아주 컸다. 그렇게 크고 과육이 달게 흐르는 오렌지는 처음 먹어 봤다. 아파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맛있는 오렌지와 다정한 엄마 손길이 기억에 남아 있다.
다시 소아과에 다녀왔다. 병원에서 돌아와 아이를 카시트에서 내려주는데, 더 안겨 있고 싶다는 듯이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그대로 안고 있자 고개를 내 어깨에 폭 기댄다. 아프고 지친 것일까.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곁눈질 해 보니, 아이는 내 어깨에 기댄 채 배시시 웃고 있었다.
엄마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잘 마쳤다고 한다. 오늘 같은 날은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외할머니는 7년 전에 돌아가셨다. 엄마는 70대 노인인데도 언젠가 당신에게는 이제 엄마라고 부를 대상이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아이 머리에 내 볼을 맞대며 속으로 말했다.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단다. ’
엄마가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엄마를 만나고 왔다.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그저 엄마 곁에 잠시 있다가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다. 엄마는 “어서 아이에게 가 보라”고 한다. 자식이란, 엄마란 이런 것인가.
|김혜인. 중견 교사이자 초보 엄마. 느린 아이와 느긋하게 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