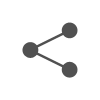올 하반기(7~12월)에도 부동산시장에 불확실성이 감지된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하며 연쇄 반응이 올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요지부동이라 각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도 여전하다.
올 하반기(7~12월)에도 부동산시장에 불확실성이 감지된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하며 연쇄 반응이 올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요지부동이라 각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도 여전하다.
상반기(1~6월) 막바지인 이달 5만가구 분양이 예정돼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8배 넘게 뛰었지만 지난 3월 청약홈 개편과 4월 총선 등 굵직한 이벤트에 따른 공급 지연 여파가 크다는 시각이다. 분양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
상반기 막바지 털어내는 분양물량
━
주요 건설업체가 올 하반기 분양시장의 여러 불확실성 요소를 감안해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 대규모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전망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만~5만가구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 전국 55곳에서 모델하우스 개관과 함께 총 4만9908가구의 아파트 청약이 진행되며 이 가운데 3만7638가구(민간 기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실적인 9808가구(일반 8784가구) 보다 약 5.1배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전년(3969가구) 보다 약 8배 늘어난 3만982가구(일반 2만745가구)로 전체의 62.1%를 차지한다. 지방도시는 1만2가구(일반 1만929가구)로 22.0%, 지방광역시는 7024가구(일반 5964가구)로 집계돼 15.9%의 비율을 나타냈다.
직방에서는 6월 분양 예정 물량을 전국 44곳, 3만9393가구(일반 2만9340가구)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에 기록한 1만9333가구(일반 1만5341가구)보다 103.8% 늘어난 수치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물량도 늘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정비사업 분양 예정 물량은 1년6개월(2022년 12월 2만5520가구) 만에 최다인 1만6840가구(총 가구수 기준)다.
6월 정비사업 공급 물량 가운데 80% 이상(1만3776가구)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올 들어 5월까지 매월 평균 분양 물량이 2만가구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6월 들어 급증한 공급 예정 물량이 ‘털어내기’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
경기 불황 지속 예측… 부담 덜고 간다
━
업계에서는 상반기 막바지에 지난해보다 늘어난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봄 성수기(3~5월)에 계획됐던 물량이 3월 청약홈 개편, 4월 국회의원 선거 등 굵직한 이벤트 여파로 공급이 지연된 탓도 있지만 앞으로도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예측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하반기에도 고금리와 자재가격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가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상반기에 예정했던 물량을 하반기로 넘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 불황과 불안 요소가 하반기에 갑자기 반전될 리 없고 진행 중인 정비사업 등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여전해 부담을 떠안고 갈수 없다”고 토로했다.
계속되는 고금리 역시 부담이다. 최근 ECB가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했지만 미국 일자리가 최근 27만2000개가 늘어난 것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Fed가 금리 인하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금리에 따른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한 만큼 이 역시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 초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건설기업 자금사정 조사'(102개사 응답)를 실시한 결과 자금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3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높은 차입금리(24.5%)와 신규계약 축소(16.7%) 순으로 응답해 고물가와 고금리를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지목했다.

━
줄어든 주택 착공 실적… 각종 지표 암울
━
하반기에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점은 각종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눈에 띄는 점은 주택 착공 실적 감소다. 올 1분기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5만7153호)대비 20.6% 줄어든 4만5359호로 조사됐다.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2만4165호로 전년(3만3589호)대비 28.1% 감소했고 지방은 2만3564호→ 2만1194호로 집계돼 10.1% 줄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분양가가 아직도 상승 요인이 남아 있어 여전히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올 들어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 최고 기록이 나온 지역은 서울·부산·대전·충북·충남·전북 등 6곳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1월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3.3㎡당 1억3771만원에 공급돼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같은 달 3.3㎡당 6831만원에 분양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보다 7000만원가량 비싼 분양가다. 부산에서도 같은달 수영구 ‘테넌바움294Ⅱ’가 3.3㎡당 6093만원에 공급돼 지역 최고 분양가 기록을 새로 썼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양가 상승세의 주된 요인을 원자재가격 인상에서 찾는다. 최근 3년(2021~2023년) 주요 건설 자재별 인상률은 ▲시멘트 가격 42%(톤(t)당 7만8800원→ 11만2000원) ▲골재 36%(㎥당 1만4500원→ 1만9800원) ▲레미콘 32%(㎥당 7만1000원→ 9만3700원) 올랐다. 이밖에 하반기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의무 민간아파트 확대 적용도 본격화 돼 분양가 상승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 분양가 경신은 공급자의 사업수익과 연결되지만 청약수요자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직결된다”고 짚었다. 이어 “원자재가격 인상 등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는 외부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청약수요자는 지역별 분양시장 공급과 수급, 청약경쟁률 등을 두루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S리포트] 조합·시공사의 곡소리… 정비사업 ‘동상이몽’
- [S리포트] 전문가 “불황 장기화, 반전 키워드는 ‘금리'”
- LG vs 롯데, 이틀 연속 ‘대환장 혈투’… 엘롯라시코 ‘명불 허전’
-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 인근 ‘부림빌딩’ 이전
- 카드론 받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