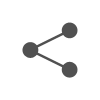한국 경제를 이끌던 산업계가 중국의 ‘굴기’ 아래 기간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처럼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됐던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며 관련 기업들도 흔들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출 물량은 2020년 약 50만대에서 지난해 100만대를 돌파하며 3년 만에 성장세 2배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전기차 1위인 비야디(BYD)는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기도 했다.
중국 전기차 성장세는 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보조금이 높게 책정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BYD는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이어갔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자 선택지를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대표 주자인 테슬라는 같은 기간 11.1% 역성장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7% 역성장하며 7위에 머물렀다. 시장점유율은 4.7%에서 3.9%로 내려앉았다.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5·6’과 ‘EV6’ 판매량이 부진한 결과다.
중국이 강세를 이어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 기존 강자들의 견제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견제가 결국 글로벌 전기차 확산에 제동만 걸 뿐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기차 패권 다툼에 시장만 축소돼 우리 기업들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전기차 관련 업체들의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폭탄’을 예고했으며 이에 중국도 EU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등 ‘맞불 대응’에 나섰다.
SNE리서치는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기차 성장에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글로벌 전기차 확산을 늦추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시장을 잡은 중국은 배터리 시장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중국 시장 제외)은 101.1GWh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중국 CATL의 배터리 탑재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6.2% 증가한 27.7GWh로 점유율 27.4%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까지 글로벌 선두를 달렸던 LG에너지솔루션 점유율은 26.9%에 그치며 2위로 미끄러졌다.
중국 시장까지 포함하면 CATL은 점유율 37.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BYD도 점유율 15.4%로 2위를 기록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점유율 13%로 3위로 떨어지는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합계 점유율은 22.9%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중국은 1·2위인 CATL과 BYD의 합계 점유율만 53.1%에 달했다.
‘저가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의 ‘굴기’ 전략은 전 산업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철강 역시 중국의 ‘저가 후판’ 공세에 국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입된 중국산 후판은 421만톤(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 물량은 147만t이다. 1년 새 수입 물량이 약 300만t 증가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면서 중국산 후판이 한국 시장으로 더욱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석유화학 업종도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공급과잉 이슈로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 성장이 부진한 영향도 크게 작용하면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굴기는 첨단산업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2010년대 ‘디스플레이 굴기’를 외친 중국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기존 강자들과 ‘치킨 게임’을 벌인 끝에 LCD 패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을 전부 철수했으며 LG디스플레이도 국내 TV용 LCD 라인업은 문을 닫았다. 유일하게 남은 중국 광저우 LCD 생산라인도 올해 내로 중국 업체에 매각될 것이 유력하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까지 노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지난달 3440억 위안(약 64조6720억원) 규모라는 사상 최대의 3차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진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하자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SMIC를 비롯한 중국 내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자본을 대거 투입했다.
- [기로에 선 재계] ‘추락이냐 초일류냐’… 사업부진·사법·노조 ‘3대 리스크’에 발목잡힌 재계
- [기로에 선 재계] 해외 점검 마친 재계 총수들···위기대응 전략 마련 총력
- 경륜경정, 제17기 경정 선수 후보생 졸업식 열려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당정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경로당 냉방비 17만5000원 지원” 外
- 쿠팡, 美 증권거래위에 “공정위가 업계 관행 제재” 공시